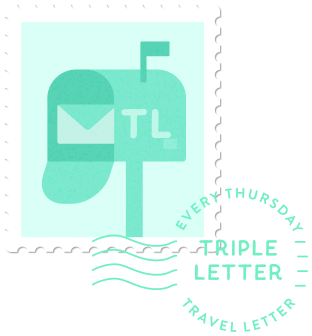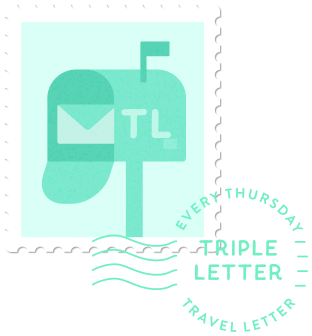|
|
|
2013년, 23살이 되던 해에 1년 남짓 만난 자칭 ‘여행 고수’ 남자친구를 덥석 믿고 3개월간의 해외여행을 떠났다. 태국-네팔-인도에 각 1개월 정도씩 머물렀는데 그 중 메인은 히말라야 EBC 트래킹이었다.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봉우리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베이스캠프(Everest Base Camp) 근처를 찍고 돌아오는 코스로,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정보에 따르면 길 자체는 한라산, 지리산보다 훨씬 쉽다길래 “한번 가보지 뭐!” 가벼운 마음으로 평소 입는 겨울점퍼에 워터프루프 등산화만 하나 챙겨 떠났다. |
|
|
15인승 비행기를 타고 루클라(2,800m)에 도착해 9일에 걸쳐 EBC 근처 고락쉡(5,140m)까지 오른 다음 다시 6일에 걸쳐 루클라로 내려오는 총 14박 15일간의 일정이었다. |
|
|
|
|
트래킹 2일차. 몬조(2,830m)에서 아주 가파른 길을 따라 약 600m 위 남체(3,440m)로 올랐던 날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날이었다. |
|
|
14일 치 짐을 메고 지그재그로 된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자니 어깨는 아프고 종아리는 땅기고 정신은 아득해지고. 떨어지는 기온에 체온 뺏길까 털모자를 눌러쓴 탓에 차가운 땀까지 흘리며 정말 죽을 것 같은 4시간을 보낸 후 겨우 남체에 도착했다. 거의 다 올랐을 무렵 이 길이 전체 코스 중 가장 힘든 길이었다는 블로그 후기를 기억해냈을 땐 정말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. 이 같은 코스가 또 있었으면 그 길로 당장 트래킹을 포기했을 테니까. |
|
|
 | 비현실적인 설산 풍경 |
|
|
|
롯지(산장)에 드디어 짐을 풀고 뜨끈한 수프로 몸을 녹인 뒤 샤워(이때는 몰랐지만 사실상 트래킹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)까지 하고 침낭에 두꺼운 담요까지 덮고 누웠을 때, 내가 느낀 그 낯선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. |
|
|
어릴 때부터 지구력도 바닥인데다 조금만 뛰면 숨을 헥헥 거리며 벌건 얼굴로 현기증을 호소하던 나인데, 걷고 걸으며 오르고 또 오르는 그 길을 내가 왔다니! 고개만 들면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멋진 설산 덕분일까? 더 무거운 가방을 나눠 멘 남자친구와 함께여서일까? |
|
|
|
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작 오를 땐 정말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. 평소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불평도, 후회도 없었다. 불타는 열정이나 승부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. |
|
 |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... 돌계단 |
|
|
|
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, 눈 앞에 차례차례 등장하는 돌계단을 어쨌든 밟아나갔더니 어느새 도착해있었다. 나도 모르게 슬쩍 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이다. 비장함이나 호들갑 없이 이룬 작은 성공에 얼떨떨하면서도 내가 몰랐던 나의 꽤 멋진 모습이 낯설고 뿌듯했다. 살면서 종종 이날 밤의 그 느낌을 떠올릴 때가 있다. 그리고 생각한다. 언젠가 나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. |
|
|
|
트래킹 6일 차가 지나면서는 몸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데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. 컨디션이 안 좋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가방을 바꿔 메준 날이었다. 그동안 더 무거운 가방을 내내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좀 들마 하며 흔쾌히 가방을 바꿔 멘 후 조금 걷기 시작했을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앞서 저 멀리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.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짐의 대부분은 그의 카메라 짐. 나는 더 무거운 가방을 메기로 한 저를 위해 얇은 책 한 권도 안넣었는데, 그 많은 짐을 꾸역꾸역 들고 와놓고 컨디션 안 좋대서 좀 들어주니 저 혼자 저렇게 쌩 가버린다고? |
|
|
|
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안고 그날 묵을 롯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앉으니 ‘여기 올라서 뭐 하나’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병풍처럼 펼쳐진 설산도 점점 익숙해지고, 풍경도 갈수록 돌 또는 눈으로 단순해지는데 눈에 젖어 축축한 신발과 양말, 겁 없이 길 막는 당나귀, 차갑고 퀴퀴한 담요, 천장을 달리는 쥐, 끝없는 두통, 희박한 산소,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견디고 있나. |
|
| 아마다블람, 히말라야 산맥 동쪽 봉우리 6,812m |
|
|
|
한참을 그렇게 비관하다, 바람이나 쐬러 밖에 나갔다. 마침 해가 지고 있었고 길을 꺾어 돌자마자 석양에 비쳐 붉게 물든 아마다블람이 보였다. “와- 진짜 멋지다” 하고 감탄하는 순간 방금의 짜증과 비관을 모두 잊었다. 내 평생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! 하하! 하고선 말아버렸다. 그때 남자친구와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, 그와 지금 10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. |
|
|
 | 길에서 만난 아이들 |
|
|
|
14박 15일의 히말라야를 떠올릴 때마다 결국 이르게 되는 생각은 트래킹을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결국 ‘사람’이라는 것. 히말라야 트래킹 후기와 함께 깨알 꿀팁을 아낌없이 선사한 블로거와 코스 처음부터 끝까지 갈림길 중 옳은 길을 빨간 페인트로 표기해둔 누군가와 같은 얼굴 없는 천사들. 그리고 길에서 직접 만난 이들이다. |
|
 | 정말 친절했던 롯지의 가족들 |
|
|
|
포터 없이 길을 헤매던 우리를 거두어 본인의 포터에게 함께 인솔을 부탁한 한국인 아저씨, 우리를 자신의 누이 집 저녁식사에 초대해준 현지 포터, 내려오는 길에 후들거리는 내 다리를 보고 자기 스틱을 선뜻 빌려준 일본 청년, 눈으로 축축해진 내 신발을 밤새 불을 때 말려준 롯지 주인 부부 등 트래킹 내내 도움과 감동을 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. |
|
|
 | 최정상, 칼라파타르에서 본 에베레스트 |
|
|
|
|
그 중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이상하게도 잠깐 스쳐 지나간 어느 할머니다. 고산병 때문에 계속 자는 남자친구를 롯지에 두고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가 아주 좁은 길에서 현지 할머니 한 분을 마주쳤는데, 정말 환히 웃으며 “따시델레”하고 다정하게 인사해주셨다(’따시델레’는 티벳 인사말이다.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는 거의 티벳 사람들이 산다.) 나도 덩달아 웃으며 “따시델레” 했더니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띤 채 나를 천천히 지나쳐 갔다. 그 순간이 참 따뜻했고 그래서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, 그 미소와 다정한 인사로 인해 내가 여행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. |
|
|
 | 현지 포터 누이의 집에 초대받은 날 |
|
|
|
여행을 떠나면 여행객으로서, 즉 외부인으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구별됨과 이질감이 여행의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행객 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더 크고 따뜻한 힘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살면서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시 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에게 준 힘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나를 지탱하고 있다. 다른 여행지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, 나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. |
|
|
|
|
🧳 여행자 '이빵순' 별것 아닌 것 같지만,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꿈꾸는 서비스 기획자 |
|